여의도 50배 농장 소유... 가전 기업 다이슨, 농업에 기술을 입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기차를 타고 3시간 달려 도착한 링컨셔주(州) 링컨. 이곳에는 영국 단일 농가 기준 최대 규모의 농장이 있다. 링컨셔를 중심으로 옥스퍼드셔, 글로스터셔 등까지 걸쳐 있는 이 농장의 면적은 3만6000에이커(약 145㎢)에 이른다. 여의도의 50배에 이르는 이 대규모 농장의 주인은 뜻밖에도 가전 혁신 기업 다이슨이다. 멀리 지평선이 펼쳐져 보일 만큼 광활한 대지에서 다이슨은 밀, 사탕무, 보리, 감자, 콩은 물론 해바라기까지 재배한다. 가축도 기른다. 방목한 소와 양이 이따금 시야를 가린다.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2012년부터 영국의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농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농산물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섬나라) 영국의 환경에 다이슨의 기술력을 접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죠.”

최근 농장 현지에서 만난 대니얼 크로스 다이슨 파밍(농업 부문) 매니징 디렉터는 ‘다이슨은 왜 농업에 뛰어들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 공급망을 흔들면서 식량 안보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WEEKLY BIZ는 가전 혁신의 상징이던 다이슨이 농업 현장에서 벌이는 실험을 통해 영국의 식량 안보 대비 태세를 엿봤다. 다이슨이 농장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량 안보에 경고등 켜진 英
한때 자유무역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영국이 지금 식량 안보를 걱정하고 있다. 그간 영국은 식품만큼은 비교 우위를 활용해 수입에 의존해도 된다는 믿음이 강했다. 위스키 같은 음료를 수출하고, 신선 채소나 과일은 바다 건너에서 들여오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곡물가가 요동치고 에너지 비용은 치솟았다. 팬데믹에 이어 기후 이상까지 겹치며 공급망 불안이 일상이 됐다. 다이슨 파밍의 톰 스토어 농업 연구원은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문제였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며 농기계 운영비나 온실 유지비 등이 올라) 식량 안보 이슈가 영국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영국 정부도 움직였다.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는 지난해부터 ‘영국 식량 안보 지수’를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년마다 지방정부와 함께 ‘영국 식량 안보 보고서’를 냈지만, 위기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한참 느렸다는 판단에서다. Defra는 지난해 첫 지수를 발표하면서 “영국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의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며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기후 변화의 장기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2024년의 이례적으로 습했던 겨울과 봄은 일부 국내 생산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Defra에 따르면 영국의 식량 공급 구조는 취약한 상태다. 무엇보다 수입품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2023년 기준 영국에서 소비되는 전체 식품 중 영국산은 5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유럽연합(EU·24%), EU 외 유럽(3%), 아프리카(4%) 등 외국산이 채운다. 품목별로 보면 취약 부문은 더 뚜렷이 보인다. 채소 자급률은 2021년 57%에서 2023년 53%로 낮아졌고, 영국의 대표 작물인 감자조차 같은 기간 74%에서 62%로 떨어졌다. 과일은 같은 기간 1%포인트 자급률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자급률은 16%에 그친다.
◇곡물 생산부터 전기 발전까지
영국 정부가 식량 안보에 비상등을 켜면서, 민간 기업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다이슨이 선택한 길은 ‘지속 가능한 농법’이다. 현재 다이슨의 농장에선 연간 밀 4만t, 사탕무 2만9000t, 보리 9000t, 감자 1만2000t, 콩 1500t 등 곡물과 뿌리채소류가 대량으로 생산된다. 공통점은 줄기나 뿌리 등 부산물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다. 다이슨은 이 부산물조차 그냥 버리지 않는다. 핵심은 ‘혐기(嫌氣)성 소화(消化) 설비’다. 산소를 차단한 채 미생물을 투입해 부산물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바꾼다.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연간 4만1610MWh에 이른다. 웬만한 소도시 1만40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규모다. 남은 찌꺼기는 다시 비료로 돌아간다. 이를 위해 다이슨은 관련 설비 등에 현재까지 1억4000만파운드(약 2600억원)를 쏟아부었다.
농사 방식도 남다르다. 생태계를 적극 활용한다. 해충이 들끓으면 해충을 먹는 새가 살 수 있도록 농지 한편에 둥지를 만들어준다. 반대로 농작물을 노리는 새가 날아들면, 천적인 독수리를 불러온다. 스토어 연구원은 “센서로 농장에 출몰하는 새의 종류를 감지한 뒤, 필요한 천적을 배치한다”며 “자연이 해답을 주는 방식”이라고 했다.
◇로봇이 딸기 따고 결함도 판별
다이슨 농업이 보여주는 지속 가능의 정점은 딸기다. 링컨 농장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캐링턴에 있는 유리온실에선 다이슨 농업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이 760m, 끝이 까마득해 보이는 유리온실 안. 양쪽으로 늘어선 1456줄의 딸기 화분 사이를 네 팔을 단 로봇이 미끄러지듯 오간다. 딸기 화분은 땅에 놓인 게 아니라 허리 높이에 매달린 구조다. 로봇은 팔에 달린 카메라로 딸기의 빛깔과 크기를 판별하고, 먹기 좋게 익은 딸기만 골라낸다. 따낸 딸기는 즉시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 5개를 통과한다. 이 카메라는 0.5초 만에 딸기 한 알을 360도로 훑으며 해충, 상처, 곰팡이 등 17가지 결함 여부를 판단한다. 검수를 통과한 딸기는 자동으로 수레 위 상자 40개에 담긴다. 안젤 안젤로프 다이슨 파밍 유리온실 매니저는 “모든 딸기가 다 알맞게 익어 있다는 가정하에 로봇은 1분에 딸기 7~8개를 딸 수 있는데, 이 로봇은 쉬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며 “사람은 가끔 위생복을 입고 들어와 흙에 파묻혀 있는 딸기를 꺼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온실이 효율적인 또 다른 이유는 여느 딸기 농사와 달리 3모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딸기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계절마다 다른 일조량과 온도를 맞추기 위한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데 다이슨은 이를 혐기성 소화 설비를 통해 해결했다. 안젤로프 매니저는 “혐기성 소화 설비에서 나온 전기를 활용해 발광다이오드(LED)를 켜서 일조량을 맞추고,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도 온실에서 활용한다. 온실 곳곳에는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습도, 일조량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다이슨은 이곳 유리온실에서 연간 122만5000주(株)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다이슨의 농업 실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6월부터는 화분을 마치 대관람차처럼 보이는 구조물에 실어 회전시키는 ‘회전식 재배 시스템’을 도입했다. 40분에 한 바퀴씩 돌면서 전체 딸기 화분에 햇빛을 고르게 쐬게 하는 방식이다. 마야 넬스트롭 다이슨 파밍 연구원은 “새로운 회전식 재배 시스템은 12개월 동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기존 방식보다 수확량을 250% 늘려준다”며 “3모작 혁신과 더불어 총 7.5배의 수확량 확대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국인들은 그간 아프리카나 스페인에서 수입돼 긴 운송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딱딱한 딸기 품종만을 먹어야 했다”며 “이젠 영국인들도 자국에서 생산된 부드럽고 맛있는 품종의 딸기를 연중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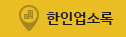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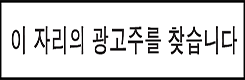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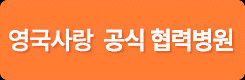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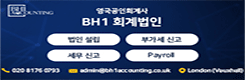
 내가 쓴 글 보기
내가 쓴 글 보기



